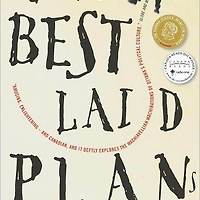지은이: 안네 홀트 (Anne Holt)
영역: 말레인 들라지 (Marlaine Delargy)
하드커버
분량: 336 페이지
분량: 336 페이지
출판사: 스크리브너
출간일: 2011년 12월27일
줄거리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베르겐으로 가던 기차가, 운전사가 불시에 사망하는 바람에 오슬로와 베르겐 중간쯤인 핀제(Finse) 근처에서 탈선 사고를 낸다. 마침 쏟아지던 눈 덕택에 승객들은 큰 부상없이 무사했지만, 다시 그 폭설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처지가 되어 근처 호텔로 모두 피신하게 된다. 폭설은 그칠 줄 모르고, 설상가상으로 세찬 바람까지 몰아쳐, 당분간은 대처로의 탈출도, 어떤 외부의 구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그야말로 밀실 환경인 셈. 방 하나 대신 제법 큰 규모의 호텔이 눈 속에 고립된 상황이니, 추리 소설에서 즐겨쓰는 밀실 살인의 확장판이라고나 할까?
아니나다를까 사제 한 사람이 얼굴에 총을 맞고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끼리만 알고 숨기려 했지만 워낙 갇힌 공간이다 보니 소문은 삽시간에 번지고, 승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사고난 기차에는 마침 한네 윌헬름젠(빌헬름젠?)이 타고 있었다. 민완 형사로 이름을 날리던 한네는 몇해 전에 일어난 불의의 총격 사건으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바람에 더 이상 경찰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문에 외출도 내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세계관도 다소 삐딱하고 냉소적이다. 그 때문에 살인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에 개입할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한네의 '직업병'이 발동한다. 살인 동기와 정황에 대한 호기심, 호텔의 여러 투숙객들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으로, 한네는 조금씩 조금씩 비밀을 벗겨나간다.
 한편 호텔의 맨 윗층을 독점한 수수께끼의 투숙객도 미묘한 불안과 긴장감을 조성한다. 그 투숙객은 기차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다른 승객들이 미처 피신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호텔의 윗층을 차지했다. 경호원들의 철저한 감시와 경호를 받는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왜 다른 투숙객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칩거하는 것일까? 노르웨이 왕족의 일가는 아닐까? 혹시 테러리스트를 베르겐으로 이송하던 중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하지만 진실은 끝내 오리무중이다.
한편 호텔의 맨 윗층을 독점한 수수께끼의 투숙객도 미묘한 불안과 긴장감을 조성한다. 그 투숙객은 기차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다른 승객들이 미처 피신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호텔의 윗층을 차지했다. 경호원들의 철저한 감시와 경호를 받는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왜 다른 투숙객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칩거하는 것일까? 노르웨이 왕족의 일가는 아닐까? 혹시 테러리스트를 베르겐으로 이송하던 중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하지만 진실은 끝내 오리무중이다.
독후감
이 소설의 지은이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북유럽의 추리소설 작가 조 네스보가 "현대 노르웨이 범죄 소설계의 대모"라고 추켜세운 안네 홀트다. 이 아줌마의 약력을 보면 누구라도 허걱! 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기자로, 뉴스 앵커로 일했고, 오슬로 경찰에서 2년간 근무했으며, 자신의 법률회사를 설립했고, 1996~1997년 2년간 노르웨이 법무부의 장관 노릇까지 했다. 이보다 더 화려하고 다채로운 경력도 드물 듯하다.
이 분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인데, 가장 유명한 것은 한네 윌헬름젠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시리즈이다. 하반신을 쓸 수 없으므로 한네가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식은 전적으로 그녀의 '회색 뇌세포'를 최대한 가동시키는 것. 따라서 독자들의 두뇌를 자극한다는 매력이 한층 더하다. 이 대목에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회색 뇌세포' 에르퀼 포와로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순서. 하지만 예리한 관찰력과 추리력을 빼면, 둘 사이에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없다. 지금까지 나온 한네 시리즈물은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이중 맨 나중 것을 가장 먼저 본 셈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한네의 상황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소설의 전체적인 사건 전개는 다소 평이하다. 호텔로 피신한 승객은 백명이 넘지만 정작 주요 용의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읽어가면 누가 범인일 것 같다는 추리를 할 수도 있는데, 내 경우에는 다소 실망스럽게도, 그 추측이 맞았다. 극적이라 할 만한 반전도 없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해 퍼즐 맞추듯 피살자의 과거를 떠올리고 그로부터 살인 동기를 유추해내는 것도 전혀 새로운 기법은 아니다.
내가 이 소설에 끌린 것은 무엇보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오슬로-베르겐 기차 노선을 내가 타봤고, 그 기억을 좋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북유럽 3국에 대해 갖는, 나 자신도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호의와 '로망' 때문이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맹추위를 지겹도록 겪는데도, 눈보라 속에 고립된 상황,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라는 설정은, 더없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런 기대에 견주면, 소설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은 다소 실망스럽다. 한네와, 그녀를 돕는 몇몇 조역들이 퍽 매력적으로 묘사되지만, 전체적으로 좀 엉성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근거리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밀화가 아니라, 멀리 하늘에 떠서 대충 조감한 그림 같다고 할까? 더욱이 사건의 축을 살인 사건과, 호텔 맨 윗층에 투숙한 수수께끼의 인물에 대한 호기심, 두 개로 잡은 것은, 적어도 중반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결말에 가서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한 채 마무리돼서 '에이, 이게 뭐야?' 하는 실망섞인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돼 버렸다.
한네를 내세운 전작들은 이보다 더 촘촘하고 박진감 있을까? 책 말미에, 1993년 데뷔작 <Blind Goddess>의 첫 장을 맛보기로 붙여놓았다.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이, 노르웨이 현지에서 출판된 순서와 달랐던 모양이다. 한두 권쯤 더 읽어봐야겠지만, 적어도 이 책 <1222>에 관한 한, 그저 범작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어쩌면 번역자의 탓도 있을지 모르겠다. 문장이 자주 껄끄럽고 어색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별점은 다섯 개 만점에 세 개.
출간일: 2011년 12월27일
줄거리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베르겐으로 가던 기차가, 운전사가 불시에 사망하는 바람에 오슬로와 베르겐 중간쯤인 핀제(Finse) 근처에서 탈선 사고를 낸다. 마침 쏟아지던 눈 덕택에 승객들은 큰 부상없이 무사했지만, 다시 그 폭설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처지가 되어 근처 호텔로 모두 피신하게 된다. 폭설은 그칠 줄 모르고, 설상가상으로 세찬 바람까지 몰아쳐, 당분간은 대처로의 탈출도, 어떤 외부의 구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그야말로 밀실 환경인 셈. 방 하나 대신 제법 큰 규모의 호텔이 눈 속에 고립된 상황이니, 추리 소설에서 즐겨쓰는 밀실 살인의 확장판이라고나 할까?
아니나다를까 사제 한 사람이 얼굴에 총을 맞고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끼리만 알고 숨기려 했지만 워낙 갇힌 공간이다 보니 소문은 삽시간에 번지고, 승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사고난 기차에는 마침 한네 윌헬름젠(빌헬름젠?)이 타고 있었다. 민완 형사로 이름을 날리던 한네는 몇해 전에 일어난 불의의 총격 사건으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바람에 더 이상 경찰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문에 외출도 내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세계관도 다소 삐딱하고 냉소적이다. 그 때문에 살인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에 개입할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한네의 '직업병'이 발동한다. 살인 동기와 정황에 대한 호기심, 호텔의 여러 투숙객들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으로, 한네는 조금씩 조금씩 비밀을 벗겨나간다.

A가 오슬로, B가 핀제, 그리고 C가 베르겐이다. 소설의 제목 '1222'는 기차 승객들이 피신한 호텔이 선 곳의 해발 높이다. 1222m. 나도 오래 전에 이 코스로 기차 여행을 한 적이 있다 ^^
독후감
이 소설의 지은이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북유럽의 추리소설 작가 조 네스보가 "현대 노르웨이 범죄 소설계의 대모"라고 추켜세운 안네 홀트다. 이 아줌마의 약력을 보면 누구라도 허걱! 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기자로, 뉴스 앵커로 일했고, 오슬로 경찰에서 2년간 근무했으며, 자신의 법률회사를 설립했고, 1996~1997년 2년간 노르웨이 법무부의 장관 노릇까지 했다. 이보다 더 화려하고 다채로운 경력도 드물 듯하다.
이 분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인데, 가장 유명한 것은 한네 윌헬름젠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시리즈이다. 하반신을 쓸 수 없으므로 한네가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식은 전적으로 그녀의 '회색 뇌세포'를 최대한 가동시키는 것. 따라서 독자들의 두뇌를 자극한다는 매력이 한층 더하다. 이 대목에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회색 뇌세포' 에르퀼 포와로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순서. 하지만 예리한 관찰력과 추리력을 빼면, 둘 사이에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없다. 지금까지 나온 한네 시리즈물은 이렇다.
The Hanne Wilhelmsen series (출처: 위키피디아)
1993 Blind gudinne (Blind Goddess)
1994 Salige er de som tørster (Blessed Are Those Who Thirst)
1995 Demonens død (Death of the Demon)
1997 Løvens gap (co-authored with Berit Reiss-Andersen) (The Lion's Mouth)
1999 Død joker (Dead Joker)
2000 Uten ekko (co-authored with Berit Reiss-Andersen) (Without Echo)
2003 Sannheten bortenfor (The Truth Beyond)
2007 1222그러니까 나는 이중 맨 나중 것을 가장 먼저 본 셈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한네의 상황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소설의 전체적인 사건 전개는 다소 평이하다. 호텔로 피신한 승객은 백명이 넘지만 정작 주요 용의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읽어가면 누가 범인일 것 같다는 추리를 할 수도 있는데, 내 경우에는 다소 실망스럽게도, 그 추측이 맞았다. 극적이라 할 만한 반전도 없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해 퍼즐 맞추듯 피살자의 과거를 떠올리고 그로부터 살인 동기를 유추해내는 것도 전혀 새로운 기법은 아니다.
내가 이 소설에 끌린 것은 무엇보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오슬로-베르겐 기차 노선을 내가 타봤고, 그 기억을 좋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북유럽 3국에 대해 갖는, 나 자신도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호의와 '로망' 때문이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맹추위를 지겹도록 겪는데도, 눈보라 속에 고립된 상황,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라는 설정은, 더없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런 기대에 견주면, 소설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은 다소 실망스럽다. 한네와, 그녀를 돕는 몇몇 조역들이 퍽 매력적으로 묘사되지만, 전체적으로 좀 엉성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근거리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밀화가 아니라, 멀리 하늘에 떠서 대충 조감한 그림 같다고 할까? 더욱이 사건의 축을 살인 사건과, 호텔 맨 윗층에 투숙한 수수께끼의 인물에 대한 호기심, 두 개로 잡은 것은, 적어도 중반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결말에 가서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한 채 마무리돼서 '에이, 이게 뭐야?' 하는 실망섞인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돼 버렸다.
한네를 내세운 전작들은 이보다 더 촘촘하고 박진감 있을까? 책 말미에, 1993년 데뷔작 <Blind Goddess>의 첫 장을 맛보기로 붙여놓았다.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이, 노르웨이 현지에서 출판된 순서와 달랐던 모양이다. 한두 권쯤 더 읽어봐야겠지만, 적어도 이 책 <1222>에 관한 한, 그저 범작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어쩌면 번역자의 탓도 있을지 모르겠다. 문장이 자주 껄끄럽고 어색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별점은 다섯 개 만점에 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