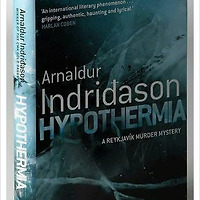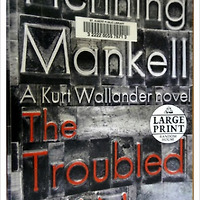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범죄 소설가 아날두르 인드리다손의 <혹한>(Arctic Chill, 2008년>을 읽었다. 에를렌두르, 엘린보그, 시구두르 올리 세 형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위 '레이캬비크 스릴러' 시리즈 중 다섯 번째 (레이캬비크는 아이슬란드의 수도).
그 앞에 나온 네 권, <오염된 피>(Tainted Blood, 'Jar City'라는 제목으로도 나왔다, 2000년, 영화평은 여기), <묘지의 침묵> (Silence of the Grave, 2001년), <목소리> (Voices, 2003년), 그리고 <말라가는 호수>(The Draining Lake, 2004년)를 예외없이 다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터여서 이 소설에 대한 기대도 꽤 높았다. 그리고 그 기대는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 '역시 인드리다손!'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 만족감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다. <Arctic chill>을 마치자마자 그 다음 편 <저체온증> (Hypothermia, 2009년)을 도서관에 찜해놓았다. 이번 주말 중에 읽어볼 계획. 기대 된다. 그 뒤로도 네 권이 더 줄을 서 있다.
인드리다손의 '레이캬비크 스릴러'를 지배하는 정조는 암울함이다. 날씨가 그렇고, 주인공들이 그렇고, 범죄와 연루된 인물들이 그렇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렇다. 무엇보다 범죄의 양상이 그렇다. 어둡고 침울함을 넘어 잔혹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때도 많다. 그렇지만 독자의 마음까지 그러한 암울함 속에 몰아넣지는 않는다. 그 어둡고 침울한 정서 속에서, 미묘한 희망을 읽게 되는 까닭이다. 아니,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엄혹하고 우울한 삶의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힘, 회복 탄력성(resiliency)을 읽게 되는 까닭이다.
<Arctic chill>은 일단 그 제목부터 으스스한데, 푸르스름한 표지조차 엄동설한의 살풍경을 담고 있다. 무대가 아이슬란드지만 살인적이라 할 겨울 추위를 묘사하는 대목은 캐나다의 실상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래서 더욱 깊이 공감된다. 많은 소설이 그런 것처럼 이 제목 또한 중의적이다. 아이슬란드의 북극 추위를 묘사하는 표현이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몇몇 사람들의 몰인간적 정서, 특히 외부인에게 적대적인 현지인들의 인종 차별적 심상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북극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어느 겨울날, 열 살바기 어린이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에를렌두르가 지휘하는 수사 팀은 희생자가 태국의 이민자라는 점에 주목해 인종 갈등 쪽에 무게를 둔다. 겉으로는 더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아이슬란드 사회. 그러나 그 밑에 도사린 어두운 비밀의 한 단면이, 꿈 많은 어린이의 비극을 계기로 조금씩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다.
에를렌두르가 수사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불륜 관계를 맺은 뒤 본 남편과 이혼하고 새 남자와 재혼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여성을 찾는 일도 그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하지만 도무지 찾아낼 방법이 없다. 왜 사라진 것일까? 혹시 남자가 죽이고 거짓 실종 신고를 낸 것은 아닐까? 그 남편이 이미 세 차례나 결혼-이혼 경험을 가진, '습관적 불륜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런 의심도 더욱 깊어진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죽었으리라고 추정했던 그 여성이 돌연 에를렌두르에게 전화를 걸어오면서 사안은 더욱 어지러워진다. 하지만 그 여성이 실종된 여성일까? 맞다면 왜 갑자기 종적을 감췄던 것일까?
에를렌두르의 가정사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마약 중독에 빠져 지옥을 헤매던 딸은 최악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와 화해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가끔 전화를 걸거나, 예고 없이 사무실을 찾아와 짧은 대화를 나누다 휙 사라져버리는 아들과의 관계도 별로 돈독하지는 않다. 그래도 가끔씩 찾아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만나 사귀게 된 여성과의 관계도 제자리 걸음이긴 마찬가지. 가까워질 듯, 가까워질 듯하면서도 진전될 기미가 별로 없다. 그런가 하면 에를렌두르의 수사에 늘 뜻하지 않은 통찰을 제공하곤 했던 옛 경찰 상사는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다.
<Arctic chill>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지 않은 듯 보이는 이야기들을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병치하면서 현실감 넘치게 끌어간다. 에를렌두르를 둘러싼 환경은 그처럼 까다롭고 피곤하고 우울한 내용 뿐인데, 정작 본인은 그런 환경을 지극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낸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늘 객관적 시선을 잃지 않으며, 무고한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런 태도를 표나게 드러내지도 않고, 자신을 애써 과시하거나 과장하지도 않는다. 부하인 엘린보그 여형사와 시구두르 올리에 대해서도, 때로는 꾸짖고 화도 내지만 공정한 시선, 따뜻한 심성을 잃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에를렌두르에 대해 종종 불만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의 등뒤에서 고지식함을 놀리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존경심은 더없이 깊다.
인드리다손의 에를렌두르는 여러모로 헤닝 만켈의 커트 발란더와 겹친다. 수사에 집중하는 열정, 사소하고 미묘한 단서로부터 사건 해결의 핵심을 찾아내는 탁월한 수사력,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분노,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완벽주의 등이 그렇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의 개인사에서는 온갖 인간적 결점을 드러낸다는 점까지 비슷하다.
<Arctic chill>은 인드리다손의 전작들보다 내게 조금 더 각별하게 다가왔다. 머나먼 이국으로 이민 와 온갖 고초를 겪는 태국 가정의 이야기가, 역시 이민자의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상황과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런 이방인에 대해, 변함없이 따뜻하고 이해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에를렌두르가, 그래서 더욱 멋있어 보였다. 사람의 출신이나 피부색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을 떠올리면, 에를렌두르라는 캐릭터가 갖는 미덕은 더욱 커 보인다.
버나드 스쿠더와 빅트리아 크립의 영어 번역은 원작의 정서와 속도를 잘 살렸다고 느껴졌다. 별 다섯에 네 개 반. 재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