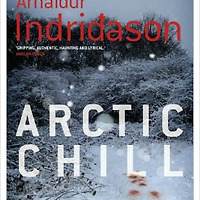레이캬비크 살인 미스터리 제6권 <저체온증> (Hypothermia)은 정본이라기보다는 외전(外傳)처럼 읽힌다. 얼렌두르 외전(外傳). 예의 3총사 얼렌두르 - 엘린보그 - 시구두르 올리가 무대의 중심에 서는 대신, 여기에서는 그 우두머리 격인 얼렌두르 혼자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 더욱이 얼렌두르가 파고드는 대상은 분명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자살로 공식 판명된 사건, 그리고 25년 전에 미제로 끝난 몇 건의 실종 사건이다. 따라서 얼렌두르는 공식 '수사'를 할 처지가 아니다. 마치 사립탐정처럼 혼자 단서들을 찾고 좇는다. 뭔가에 씌인 듯하다. 엘린보그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꼬집는 것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저체온증>은 레이캬비크 미스터리 시리즈의 핵인 얼렌두르에 대한 심층 탐구이다. 열 살때 눈 폭풍 속에서 잃어버리고 끝내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한 두 살 아래 동생, 두 자식을 데리고 나갔다가 눈 폭풍 속에서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아버지, 잃어버린 막내를 평생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 오래 전에 이혼한, 이제는 불구대천의 원수 사이로 변해 도무지 화해의 길이 보이지 않는 아내, 그 아내 밑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길러지면서 마약 중독, 혹은 알코올 중독으로 나락에 빠졌던 딸과 아들, 그들에 대한 죄책감과 부채감을 끝내 떨쳐내지 못하는 얼렌두르... 그의 삶의 주변은 한 마디로 우울하고 서글프다. 끝끝내 되찾을 수 없는 것들, 영원히 잃어버린 것들, 우연과 필연으로 씨줄과 날줄처럼 얽힌 사람들 간의 관계가 <저체온증>에서 드러난다.
<저체온증>은 크게 두 갈래의 에피소드로 진행된다. 하나는 목을 매 자살한 여성의 사례다. 모든 정황이 자살임을 보여주지만 그 친구가 얼렌두르에게 건네준 자살녀의 교령회(交靈會: 산 사람들이 죽은 이의 혼령과 교류를 시도하는 모임) 테이프 - 테이프! 이게 언젯적 골동품이냐? - 를 들으면서 호기심이 발동한다. 혹시 자살이 아닌 건 아닐까? 얼렌두르는 자살로 종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비롯한 망자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면서 차근차근 수수께끼를 풀어간다.
다른 한 갈래는 지난 25년 동안 그를 꾸준히 찾아 온 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다. 25년 전 고등학생 아들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사람들이었다.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아 도무지 그 종적을 찾을 수 없었던 실종 사건은 결국 미제로 문을 닫고 말았다. 하지만 그 부모는 끝끝내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처음에는 거의 매일, 다음에는 매달, 매년 얼렌두르를 찾아 왔다. "어떻게 됐나요? 혹시 뭔가 새로운 단서라도 찾아냈나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불치병에 걸려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이 날 얼렌두르를 찾은 것은 그 동안 고마웠다는 것,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귀찮게 했는데도 불쾌한 기색 없이, 화 한 번 내지 않고 깊은 동정심과 공감으로 자신을 대해준 데 대한 마지막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얼렌두르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다시 그 주변 인물들을 찾아 나선다. (아래 비디오는 <저체온증>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의 트레일러).
추리소설의 본령으로 따진다면 <저체온증>은 다소 수준 미달이다. 웬만한 독자라면 범인이 누구인지 소설의 중반쯤에 - 시각에 따라서는 아예 초반에 - 눈치를 챌 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정의는 끝내 실현되지 못한다. 정황 증거 말고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까닭이다. 어쩌면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DNA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풀려난 O.J. 심슨 같은 경우를 떠올린다면 물론 그럴 것 같다.
또 하나, 이 소설에는 유난히 '우연'이 남발된다. 그리고 작가 자신도 우연의 남발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니, 도리어 우연이 우리 삶에서 갖는 힘, 강력한 영향력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이 대목에서 나는 문득 '우연의 작가' 폴 오스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 25년 전의 실종 사건 -를 극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계기도 사실은 그 우연에 힘 입은 바 크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인드리다손의 우연론에 깊이 공감했다. 그가 우연의 얄궂음, 우연의 비극, 우연의 슬픔을 보여주는 사례로 얼렌두르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한 주부의 피살 사건은, 마치 액자 소설처럼, 짧은 단편처럼 읽히는데, 그 길이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은 감흥을 남긴다. 그래, 우리 삶이란 때때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우연에 의해 지배되곤 하지...라고 깨닫게 만든다. 다만 내가 저런 비극적 우연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인드리다손의 소설이 갖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저 어렴풋한 이름으로나,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혹독한 겨울로나 인식되는 아이슬란드를,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세상의 희노애락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인생의 온갖 드라마가 펼쳐지는 '사람들의 나라'로 새삼 인식시킨다는 점이다. 그들이 안고 사는 희망과 절망을 다양한 사건 속에 절묘하게 녹여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주인공 얼렌두르가 주는 매력이다. 아 저런 참경찰을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사건을 파헤치는 직관과 끈기, 꼼꼼함, 침착함은 가히 장인의 경지이고, 무엇보다 희생자들에게 보여주는 그의 동정심, 인간적인 공감의 접근법이 더없이 아름답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가 '역대 소설 속 형사들 중에서 가장 동정심 많은 인물'이라고 촌평했을까!
내가 그에게 매력을 느낀 또 한 가지 미덕은 세상사에 대한 차분하고 중립적인 시각이었다. 그는 내세도, 신도, 천국이나 지옥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금 이곳의 삶에 충실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슬란드인들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겨울조차, 얼렌두르는 그저 자연스러운 계절의 흐름이고 우리 삶의 한 조건일 뿐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인다. 그는 아이슬란드의 겨울을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얼렌두르의 행동거지와 생각에 짙게 배어 있다. 캐나다, 그 중에서도 날씨 춥기로 유명한 에드먼튼 지역에 사는 나로서는 얼렌두르의 쿨한 시각이 여간 멋있어 보이지 않았다.
<Draining Lake>에 이어 이번 소설에도 어김없이 호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 호수 속에 타의로 던져진, 혹은 자의로 몸을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는 그 호수 속에, 얼마나 많은 아이슬란드의 비극과 눈물이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다. 그런 <저체온증>을 읽으면서, 아이슬란드의 호수는 상심의 호수 (Lakes of Broken-Hearted)가 아닐까 문득 생각했다. 별점은 다섯개 중 셋.